<괴델, 에셔, 바흐> 제1부 : GEB - 서론 (3) page ~ 38
본 포스트의 내용은 괴델, 에셔, 바흐를 읽으며 기록한 것으로, 직접 인용하거나 요약한 내용임을 밝힙니다.
서론 : 음악-논리학의 헌정(A musico-logical offering) (2)
배비지, 컴퓨터, 인공지능
찰스 배비지는 해석기관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현대 폰 노이만 컴퓨터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를 고안했다. 해석기관은 창고와 작업장, 즉 기억장치와 연산 장치로 구성된 기계를 고안했고, 천공 카드에 수록된 프로그램의 제어 하에 숫자들이 연산되는 것을 상상했다.
실제 해석기관은 구현된 적 없으나, 배비지의 친구였던 에이다 러블레이스는 해석기관을 통해 인류가 기계적 지능을 다루기 시작함을 깨달았다. 해석기관이 “자신의 꼬리를 물” (기계가 자신의 내장 프로그램에 접근해 변경시킬 경우 생기는 이상한 고리를 배비지가 묘사한 표현) 수 있다면 말이다.
그러나 러블레이스는 해석기관이 무엇인가 창조할 수 있는 특성은 가지고 있지 않고, 오로지 우리가 일을 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만을 할 뿐이라고 생각했다. 즉, 인공지능의 창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.
지능적 행동과 비지능적 행동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. 그러나 다음과 같은 속성들이 지능에 본질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
- 여러 상황에 매우 유연하게 대응한다.
- 우발적인 주변 조건을 활용한다.
- 모호하거나 모순적인 메시지로부터 의미를 도출한다.
- 상황의 상이한 요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인식한다.
- 서로를 분리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황들 사이의 유사성을 찾는다.
- 서로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상황들 사이의 차이를 찾는다.
- 기존 개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들을 합성한다.
-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다.
이러한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에서 어떤 종류의 규칙을 제공할 수 있다. 그러나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칙에 대한 메타 규칙이 필요하고, 이러한 연쇄는 반복되어 여러 계층의 복잡한 규칙을 수반한다.
(사담이지만, 현재는 규칙 기반 인공지능 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신경망이 주도하고 있다. 본 서적에서 규칙 기반 인공지능을 다루는지는 현재의 내용으로는 알 수 없다.)
······그리고 바흐
바흐의 곡을 관찰하고 연주하기 위해서라면 ‘영혼’이 필요하다는 사람. 플룻을 연주하는 자동 인형을 만드는 사람. 이 두 진영 간의 논쟁은 여전히 유요하고, 이 책에서 역시 그러한 내용을 다룬다.
“괴델, 에셔, 바흐”
(재밌게도 자기-지시적인 문단이 등장한다.)
이 책은 대화와 장 사이에 대위법 구조를 가지는 색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. 대화는 비유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, 새로운 아이디어의 이미지는 배경으로 작용한다. 이어지는 장을 읽으며 아이디어는 구체화된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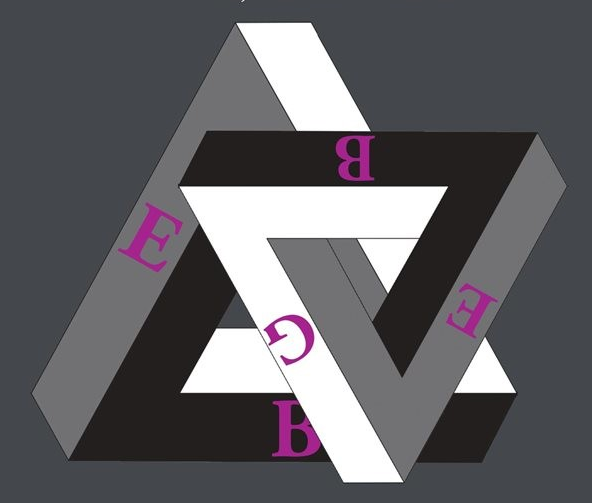
Comments powered by Disqus.